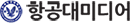1996년 나는 처음 유럽 땅에 발을 디뎠다. 그해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약 20일 가량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 그것이 우리의 신혼여행이었다. 영국으로 들어가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를 두루 둘러보았다. 배낭여행치고는 짧은 기간이었으나, 유레일패스로 마음껏 기차를 탈 수 있어서 너무나 많은 도시에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을 봤다. 기차에서, 때로는 식사를 하고, 때로는 맥주를 마시고, 때로는 잠도 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 란젤로의 「피에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고흐의 「까마귀가 나는 밀밭」, 모네의 「해돋이 인상」 등의 원작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빅벤과 런던탑, 개선문과 에펠탑, 브란덴부르크 문과 마르크 스의 동상, 바티칸 궁과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먹고, 융프라우에 오르고, 괴테의 집을 방문하고, 베토벤 강(길)을 걸었다. 모두 책에서 나 보고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었다. 마냥 좋았고 신기하기만 했다.
몇 년 전에는 러시아를 거쳐, 터키와 그리스에 다녀왔다. 약 한 달의 여행이었다. 이 세 나라를 여행하면서, 서구 문명의 깊은 뿌리를 짐작할 수 있었다. 모두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다. 그리스는 누가 뭐래도 서구 문명의 남상(濫觴)이다. 특히 델포이는 파르나소스산 중턱에 있는 작 은 시골 마을이지만, 여기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고, ‘옴파로스(배꼽)’라는 돌이 서 있다. 이곳이 바로 서구 문명의 배꼽인 셈 이다.
터키는 15세기에 발흥한 오스만 제국의 종주국으로 그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 도다. 하지만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터전이기도 했다. 기원전 660년 그리스의 식민 지였던 비잔티움(오늘날의 이스탄불)은, 서기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삼으면서 ‘콘스탄티노플’이 되었다. 동로마 제국은 이탈리아의 로마보 다 더 오랜 세월 제국의 명맥을 유지했기에 터키 곳곳에는 옛 영화(榮華)를 대변하 듯 동로마 제국의 유허(遺墟)가 남아 있다. 호머의 서사시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현 장도 바로 이 터키에 있다.
러시아의 국토는 우랄산맥을 경계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지만 통상 유럽에 속한 국가로 여긴다. 하지만 유럽 역사에서 러시아는 변방 중의 변방으로 인식됐다. 모스크바의 상트 바실리 성당은 서유럽과 다른 러시아 정교 멋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오늘날 다시 이탈리아의 바티칸이 서구 기독교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서구 기독교 문명의 중심은 로만 가톨릭에서 그리스 정교로, 콘스탄티 노플의 동방정교로, 러시아 정교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던 올해 여름 두 달 남짓 다 시 유럽을 다녀왔다. 동유럽을 거쳐, 북유럽을 좀 자세히 둘러보고, 서유럽을 거쳐 남유럽까지 두루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내 눈에 비친 유럽은 좀 복잡한 모습 이었다. 이번에 경험한 유럽은 여전히, 아니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특히 북유럽은 지상의 낙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감탄만 하고 지나칠 수 없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프라하에서였던가 빈에서였던가? 횡단 보도 곁에서 푸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 데, 쓰레기통 위에 한입 먹고 버린 햄버거가 놓여 있었다. 얼굴이 다소 초췌하지만 그래도 겉보기에 멀쩡한 청년이 그리로 다 가서더니, 그 햄버거를 집어 들었다. 나는 그 청년의 행동을 주시했다. 흥미롭게도 그 청년은 그 햄버거를 한참 동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고 조심스레 냄새를 맡아 보더니, 다시 한참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또다시 냄새를 맡더니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고뇌에 찬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유럽에는 맥주 깡통을 주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그것을 모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양이다. 대개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깡통을 모은다. 하지만 버리는 족족 바로바로 주워가니, 쓰레기통에서 깡통을 줍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공원에서 캔맥주를 마시면, 깡통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깡통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간다. 어떤 때는 공원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다 마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좀 민망해서 그냥 빨리 마신 후 깡통을 두고 자리를 뜬다.
유럽은 소매치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관광객 중에는 이런 얘기가 떠돈다. 앞 으로 메는 가방은 자기 것이고, 옆으로 메는 가방은 우리 것이고, 뒤로 메는 가방은 남의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소매치기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소매치기로 걸려 경찰서에 가도 훈방처리만 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를 하다 걸려도, 그냥 웃으며 지나간다고 한다. 헌데 소매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처벌을 강화하면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매치기를 하다가 걸리면, 범죄를 은폐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수도 있기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많은 이들이 서구 문명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한다. 유색인종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벌인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양미술사』를 곰브리치는, 그의 『세계사』에서 콜럼버스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 서벌인 서구인의 만행에 대해서, “인류 역사의 이 처참한 장을 떠올릴 때면 우리 유럽인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나 역시 이제 입을 다물고만 싶다.”고 서술하고 있다. 곰브리치의 글을 읽으니, 대영박 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세계유물들, 제국주의 시대에 강탈해 간 세계유물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번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터졌다. 역사상 최대 비극인, 지난 세기 1차 2차 세계대전도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쟁탈전의 연장선에서 벌어졌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그 연장 선상에 놓여 있다. 서구 문명에는 그 문명의 찬란한 빛만큼 깊고 어두운 그들을 드리우고 있다. 슈펭글러가 『서구의 몰락』에서 진단했듯이, 유럽은 세계사의 중심이 아니다.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 그리고 기독교 문명도 하나의 문명에 불과하다. 여전히 옴파로스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감격하지는 않는다.
2014년 1학기에 시작하였으니, 열 돌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모로 고생 하며 『항공대신문』을 간행하고 있는 편집국장과 기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언제나 마음 깊이 『항공대신문』을 응원합니다.
이 승 준(인문자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