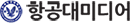유럽에는 두 개의 진주가 있다. 체코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다. 두 도시 모 두 진주처럼 빛난다. 헌데 두 도시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체코는 어둡고 웅숭깊다. 짙은 회색조의 건물들과 그 건물들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들의 음울한 얼굴들, 그런 건물들 사이로 이어지는 골목길에서는 보헤미안의 신비로운 마력마저 느껴진다. 어느 어두운 카페에서는 프란츠 카프카를 마주칠 듯도 하다. 반면 비엔나는 밝고 화창하다. 하얀 건물들이 넓은 거리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가지런히 뚫린 창은 시원스럽다.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푸른 정원에는 아름다운 분수가 무지개를 그린다. 거리거리마나 모차르트의 선율이 흘러나오는 듯하다. 프라하가 유럽의 검은 진주라면 비엔나는 하얀 진주다.
체코 비엔나를 거쳐 북구로 향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북구로 들어가려면,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핀란드로 넘어 가는게 좋다. 헌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탓에 러시아로 들어갈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비엔나에서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거쳐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들어 가야 했다. 발트 3국을 지나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페리를 타고 핀란드 헬싱키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나 발트 3국의 교통이 편치 않아 차라리 에둘러 가는 것이 편하다.
덴마크는 북구의 관문이다. 육로로 스칸디나비아반도로 가자면 코펜하겐을 거쳐 스웨덴 말뫼로 들어가야 한다. 아마도 그래서 코펜하겐이 자연스레 교통의 요지가 된 모양이다. 덴마크를 작은 반도의 나라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근대이전에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군림한 북구의 패자(霸者)였다. 그린란드는 지금도 덴마크 땅이다. 지금 지도를 보면 덴마크 동북쪽 끝에 붙어 있지만, 코펜하겐은 몇 세기 전까지만 해도 북구의 중심이었다.
스웨덴의 말뫼로 들어가 예테보리를 거쳐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이르렀다. 오슬로 에서 베르겐으로 베르겐에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그리고 다시 스톡홀름에서 노 르웨이의 나르비크까지 올라갔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오랜 기간 한 나라였지만 지 금도 두 나라를 오가지 않으면 여행할 수 없었다. 오로라의 도시 트롬쇠까지 올라가려 했으나 시즌이 아니라 오로라를 볼 수 없다 하여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스웨덴 룰레오로 가서 국경을 넘어 핀란드 케미로 갔다. 그리고 오울루를 거쳐 헬싱키에 도달했다. 그리고 트루쿠에서 페리를 타고 발트해를 건너 다시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그렇게 스칸디나 반도를 한 바퀴 돌았다.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반도는 한 덩어리 의 땅 위에서 서로 부딪치며 역사를 일구어 왔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깊은 친연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핀란드는 러시아와 더 깊은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 앞의 세 나라를 하나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바이킹의 후예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핀란드는 아시아에 뿌리를 두고 슬라브 계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살아왔다. 발트해는 양자를 이어주는 교량이기도 하고 나누는 경계이기도 하다.
북구의 자연경관은 어디나 아름답다. 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노르 웨이였다. 빙하기에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드러난 땅, 소위 말하는 피오르 지 형의 삼림 계곡은 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특히 오슬로에서 베르겐까지 삼림을 가로지르고 달리는 기찻길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해도 좋을 것이 다. 울울창창 짙푸른 삼림, 멀리 산꼭대기에서 빛을 발하는 만년설, 산기슭을 타고 내리치는 폭포들, 곳곳에 펼쳐진 맑은 호수, 거세게 굽이치는 험한 강물, 그 자연경관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노르웨이의 숲’을 보았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중 하나가 베르겐이었다. 오슬로에서 베르 겐에 이르는 길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르겐 자체가 유서 깊은 도시이며, 무엇보다 그곳은 노르웨이의 음악가 에드 바르 그리그의 고향이기도 하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을 듣고 그 마법 같은 매력에 푹 빠진 적이 있다. 베르겐 외곽에는 바로 그 그리그가 만년까지 작곡하며 부인과 함께 살던 ‘트롤하우젠’이 있다. 트롤은 북구의 도깨비(우리로 말하면)이며 하우젠은 언덕이다. 베르겐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부려놓고 트롤 하우젠으로 향했다. 베르겐 시내에서 트램을 타고 약 30분 동안 교외를 달려 ‘호프’역에서 내렸다. 다시 약 30분을 더 걸어야 했다. 햇살이 스며드는 옅은 나무 터널의 길 은 호젓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작은 신식 건물이 보였다. 박물관이다. 박물관 아래에는 그리그 의 동상, 저택, 작곡가의 오두막과 벤치들이 있다. 바닷가 언덕에 자리잡은 이 트롤하우 젠은 소박하면서도 수려하고, 화창하면서도 신비롭다. 마치 동화에 나올 법한 공간이다. 저택과 언덕도 좋았지만, 작곡가의 오두막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다. 정면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창 앞에 넓은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작곡가가 작곡 도중 잠시 쉬러 나간 듯 악보가 펼쳐있고 그 위에 펜이 가로놓여있다. 한쪽에는 작은 피아노와 흔들의자가 다른 쪽에는 간이침대가 놓여 있다. 귓가에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이 들리는 듯했다.
이 승 준(인문자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