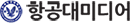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어떤 걸까요?
“작년에 썼던 성능기반항행, PBN에 대한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쓰고 싶은 아이템은 아니었는데, 휘권이형의 권유로 한 번 써보았죠. 인터뷰와 자문에 힘써주신 대한항공 박태하 부장님의 특강과 저희 학부 남석우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기사를 준비했는데, 자료조사도, 공부도 정말 많이 필요한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좋은 기사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항공상식>이라는 코너에 맞게 쉽게 설명하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봐주셨을지는 독자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항공대신문은 어떤 신문입니까?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항공대신문은 ‘2% 아쉬운 신문’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우리 신문사 기자들의 능력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고 능력도 있는 기자들입니다. 그저 환경이 아쉬울 뿐이죠.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의 신문을 보고 우리 신문을 보면 비교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내, 교외의 소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우리 학교와는 달리, 대학가의 현실과 풍토, 관련된 사회 문제 등 깊은 고찰과 분석이 있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런 학보가 나오진 않지요. 이를 뒷받침해줄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데, 항공대신문의 경우 이러한 환경이 정말 딱 ‘2%’ 부족합니다.”
환경이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건 ‘인력’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신문사에 지원도 해주셨고, 덕분에 많은 기자를 갖출 수 있었지만,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5명 내외였지요. 써야 하는 기사의 양은 정해져있는데, 기자의 수가 적다보니 개개인이 맡아야 하는 기사의 양이 많아졌고, 이는 결국 기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지금은 한 명이 한 두 개의 기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도 훨씬 수월하고 그 질도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환경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면을 통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화제를 돌려보죠. 지난 1년 간 편집국장으로서 스스로를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음…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낸 국장? 사실 저는 제가 편집국장이 된 이유가 제가 특별히 글을 잘 쓰거나 능력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문사에 오래 있었고, 편집국장으로서 신문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4학년이어서 된 거라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왕 편집국장의 자리에 앉았으니, 기존의 체제나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사내 문화는 바꿔보고자 했어요. 좀 더 수평적이고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선택한 아이템과 기사에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말이죠. 가끔은 이게 맞는 방식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에 추구하고자 했던 문화는 어느 정도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하지 못해 아쉬운 것도 있습니까?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고 한때 개인주의에 푹 빠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을 완전히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론 이 개인주의가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밥먹고 술먹는 회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여행이라도 가면서, 이미지 사진도 찍으면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더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진제씨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 일단은 조금 쉬고 싶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이 곧 다가오고는 있지만, 4학년 2학기라 그런지 마음의 부담은 덜하네요. 그동안 서점에서 사놓기만 하고 읽지 않았던 책들도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고, 보고 싶던 드라마나 영화도 볼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요. 사실 신문 만든다고 모든 걸 다 떼어놓고 살았던 건 아닌데, 이제는 기삿거리도, 취재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더 가볍고 편합니다.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졸업과 임관이 다가오겠죠. 멋있게 학사모도 던지고, 사진도 찍고, 임관식도 가고. 그런 다음엔… 그저 앞에 놓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걸어가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건가요?
“우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문을 그리 자주 발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우분들과의 교류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가는 기사, 읽고 싶은 기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드리지 못한 것도 같아 저 또한 많이 아쉽습니다. 내년의 신문사도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문사 친구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단번에 핵심을 파고드는 날카로움, 더 좋은 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가슴을 울리는 문장까지. 여러분 모두 정말 훌륭한 기자들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부족한 제가 쓰러지지 않고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어 고맙습니다. 지난 일 년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훗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길게 말하면 오글거릴 것 같으니, 그냥 짧게,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네요.“
자리를 떠나며 그는 「당신은 나의 옛날을 살고 나는 당신의 훗날을 살고」라는 시집 한 권을 선물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오늘을 지우고 옛날과 훗날만을 남기면 옛날은 사라져도 오랫동안 빛으로 반짝이게 되며, 훗날은 아직 채워지지 않은 시간이니 내가 살아가면서 채우면 된다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빛나고 또 채울 여지를 갖는다고. 신문사에서의 시간도 이처럼 그의 옛날로 남아 오랫동안 빛으로 반짝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