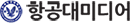지난 여름 인도 동북부와 네팔을 다녀왔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인도의 콜카타(예전에는 캘커타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영국 식민지 시절의 이름이라, 지금은 콜카타라는 옛 이름을 쓴다.)로 들어가, 바라나시와 사르나스-가야와 보드가야-파트나와 바이샬리-고락푸르와 쿠시나가르를 지나서, 다시 네팔의 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를 여행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 큰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처음 설법한 사르나스 그리고 열반에 든 쿠시나가르를 중심으로 여정을 정했다. 비록 내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인류의 큰 스승인 붓다의 행적을 좇아보면서, 그 도저한 사색의 터럭 끝이나마 더듬어 보고자했다. 크게 보면 인도 문화권에 드는 네팔도 여행하면서, 인도 문화를 폭넓게 느껴보고 싶었다.
인도를 여행하고 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한다. 인도라는 나라에 완전히 질려 거기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과 그 매력에 깊이 매혹되어 계속 인도 여행을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인도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여행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며 거기다가 다소 위험하기까지 한 나라이기에, 전자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반면, 삶의 신비로운 내면을 숨기고 있는 듯 한 자유로운 정신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야릇한 영혼의 해방감과 모호한 정신적 깨달음을 맛보는 곳이기에, 후자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자와 같은 경험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 후자와 같은 반응으로 변모하는 지도 모르겠다. 인도에 대해서 제법 안다는 사람들은 양자를 모두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도는 그들이 믿는 신이나 쓰는 언어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얼굴을 지닌 나라이기 때문이다.
인도의 특징을 한몸에 느끼고 싶다면, 바라나시에 가보라고 한다. 기원전 6세기 경 카시왕국의 수도였던 유서 깊은 도시 바라나시는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바라나시의 그 신성함은 갠지스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성한 강 갠지스가 바라나시를 안고 유유히 흐른다. 그 강은 세계 신들의 성처럼 펼쳐져 있는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였다. 강가(흥미롭게도 인도말로도 ‘강가’라고 부른다.)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힌두교 사원들이 늘어서 있으며, 그 뒤로는 거미줄같이 복잡한 골목길을 이루는 상가와 가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계단이 사원에서 강으로 웅대하게 이어진다. 이를 ‘가트’라고 부른다. 강가를 따라 4km에 걸쳐 가트가 이어져 있다. 인도인들은 자신의 업을 소멸하고자 가트에서 갠지스에 몸을 담근다. 이곳을 찾는 인도인의 수가 1년에 100만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인도인이 신성하다고 믿는 만큼 가트가 깨끗하지는 않다. 가트에는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명상에 잠겨 있는 구도자, 계단에 앉아서 꿈같은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 관광객이 지나가면 보트를 타라고 ‘보트, 보트’하고 소리 지르며 관광객을 귀찮게 구는 뱃사공, 비위생적으로만 보이는 길거리 음식 판매상, 아무데서나 널브러져 자는 직업을 알 수 없는 지저분한 시민들, 강에서 천진난만하게 멱을 감는 아이들, 지나가면 누구에게나 손을 내미는 걸인과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저기 유유히 걷거나 엎드려 있는 소들, 죽은 듯이 늘어져 잠을 자는 개들이 카오스처럼 얽혀 있다. 그 모두가 먹다버린 음식이나 배설물이 바닥에 다채로운 무늬를 만든다. 한쪽에선 강물에 몸을 담그며 업을 씻고, 한쪽에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으며, 한쪽에선 싸구려 비누로 목욕하고 빨래하며, 또 한쪽에선 시체를 태운다. 바라나시는 인도의 다양한 얼굴을 한몸에 지닌 도시다.
바라나시 도심에서 북쪽으로 10km 지점에는 붓다가 처음 설법한 사르나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지금은 바라나시의 일부이다. 보리수 밑에서 6년을 고행하던 붓다는 고행이 대각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닫고, 수자타라는 여인이 준 우유죽을 먹고 힘을 내 명상에 들어, 비로소 큰 깨달음에 이른다. 그와 함께 고행을 하던 다섯 수행자는 우유죽을 먹은 붓다를 비난하지만, 붓다는 그들을 설법하여 감화시킨다. 그 설법의 내용이 중도(中道)와 팔정도이다. 이를 초전법륜(처음으로 다르마(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다.)이라 하는데, 이 최초의 설법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사르나스이다. 여기에는 거대하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사원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붓다가 입멸한 후 약 3세기 후 불교 융성에 힘쓴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지은 것이다. 사르나스에는 사슴이 많다하여 녹야원(鹿野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도 거기에는 사슴공원이 있다.
나는 바라나시에서 4일을 머물렀다. 하루는 사라나스에 가서 붓다의 유적을 두루 둘러보았다. 바라나시의 주요 사원에 가보고, 가트 뒤의 복잡한 상가 골목길도 걸어 다녔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가트에서 보냈다. 숙소에서 발을 내딛으면 바로 가트였다. 가트에 나갈 때면 인도 사람처럼 맨발로 다녔다. 가트에는 맨발로 다니기에 좋게 매끄러운 돌을 깔아놓았다. 가트를 맨발로 걸으면, 약간 아프기도 했지만 맨발에 닿는 돌의 감촉은 상쾌하게 발바닥을 자극했다. 맨발로 가트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유유자적 거닐었다. 저쪽 끝에 도달할 즈음 화장터가 있었다. 1미터 넘게 쌓은 통나무 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대부분 인도인은 여기서 자신의 육신이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 가트에 누워서 죽은 듯이 늘어지게 낮잠도 잤다. 아닌 게 아니라 갠지스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머니의 숨결 같았다.